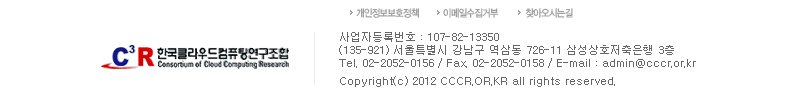мҡ”мҰҳ мқјмһҗлҰ¬ л¬ём ңлҠ” лӢЁмҲңнһҲ л…ёлҸҷмӢңмһҘ л¬ём ңмқҳ лІ”мЈјлҘј л„ҳм–ҙм„ңкі мһҲлӢӨ. мқјмһҗлҰ¬лҠ” м§ҖмҶҚ к°ҖлҠҘн•ң ліөм§ҖмҷҖ мқёк°„лӢӨмҡҙ мӮ¶мқ„ мң„н•ң кё°ліё мЎ°кұҙмқҙлӢӨ. м •л¶Җк°Җ кі мҡ©лҘ 70%мҷҖ мӨ‘мӮ°мёө 70%лҘј к°ҷмқҖ м°Ёмӣҗм—җ лҶ“кі м •мұ…м ҒмңјлЎң л…ёл Ҙн•ҳлҠ” кІғлҸ„ мқҙлҹ° л§ҘлқҪм—җм„ңлӢӨ.
мқјмһҗлҰ¬лҠ” к°ҖлҠҘн•ң н•ң л§Һмқҙ л§Ңл“Өм–ҙм•ј н•ңлӢӨ. м •л¶ҖлҠ” к·јлЎңмӢңк°„ лӢЁм¶•мқ„ нҶөн•ң мқјмһҗлҰ¬ лӮҳлҲ„кё°мҷҖ н•Ёк»ҳ мӢңк°„м„ нғқм ң мқјмһҗлҰ¬мқҳ нҷ•мӮ°мқ„ 추진н•ҳкі мһҲлӢӨ. н•ҳлҘҙмё к°ңнҳҒ(2003л…„)кіј л°”м„ёлӮҳлҘҙнҳ‘м•Ҫ(1982л…„) мқҙнӣ„ кі мҡ©лҘ м—җм„ң мғҒлӢ№н•ң м„ұкіјлҘј ліҙмқҙкі мһҲлҠ” лҸ…мқјкіј л„ӨлҚңлһҖл“ң л“ұ мӮ¬лЎҖлҘј ліҙл©ҙ м Ғм Ҳн•ң м •мұ…л°©н–ҘмқҙлӢӨ. лӢӨл§Ң, л…ёлҸҷмӢңмһҘ мқҙмӨ‘кө¬мЎ° л¬ём ңмҷҖ кі„мёө к°„ к·јлЎңмЎ°кұҙмқҳ м°Ёмқҙк°Җ мӢ¬нҷ”лҗҳм–ҙ мһҲлҠ” л…ёлҸҷмӢңмһҘмқҳ нҳ„мӢӨмқ„ к°җм•Ҳн• л•Ң мқјмһҗлҰ¬лҘј м–‘м ҒмңјлЎң лҠҳлҰ¬лҠ” кІғкіј лі‘н–үн•ҳм—¬ мқјмһҗлҰ¬мқҳ м§Ҳмқ„ лҶ’мқҙлҠ” лҚ°м—җлҸ„ к°ҷмқҖ мҲҳмӨҖмқҳ л…ёл Ҙмқҙ н•„мҡ”н•ҳлӢӨ.
кё°мҲ нҳҒмӢ кіј мғқнҷң м–‘мӢқмқҳ лӢӨм–‘нҷ”лЎң мқён•ҙ м§Ғм—… м„ёкі„лҸ„ лӢӨм–‘н•ҳкІҢ 분нҷ”В·л°ңм „н•ҳкі мһҲлӢӨ. кіјкұ°м—җлҠ” лҜёмІҳ мғқк°Ғн•ҳм§Җ лӘ»н•ҳлҚҳ нӢҲмғҲ мӢңмһҘм—җм„ң л§ҺмқҖ мқјмһҗлҰ¬к°Җ мғқкІЁлӮҳкі мһҲлӢӨ. мҠӨнӢ°лёҢ мһЎмҠӨк°Җ л§җн•ң кІғмІҳлҹј 'лҲ„кө°к°Җк°Җ к·ёкІғмқ„ м ңмӢңн•ҙмЈјкё° м „к№Ңм§ҖлҠ” мһҗмӢ мқҙ л¬ҙм—Үмқ„ мӣҗн•ҳлҠ”м§Җ лӘЁлҘҙлҠ”' кІҪмҡ°лҸ„ л§ҺлӢӨ. мқҙлҹ° м җмқ„ мһҳ нҷңмҡ©н•ҳл©ҙ 'м—ӯл°ңмғҒ'мңјлЎң м „м—җ м—ҶлҚҳ мғҲлЎңмҡҙ мқјмһҗлҰ¬лҘј л§Ңл“Өм–ҙ лӮҙм–ҙ мқјмһҗлҰ¬м—җ лҢҖн•ң мҲҳмҡ”лҘј м°Ҫм¶ңн• мҲҳлҸ„ мһҲлӢӨ.
мҳҲлҘј л“Өм–ҙ мқён„°л„· кі„м •мқҙлӮҳ лҢ“кёҖ л“ұ мӮ¬мқҙлІ„ кіөк°„м—җм„ң кі мқёмқҳ нқ”м Ғмқ„ м§Җмҡ°лҠ” мқјмқ„ н•ҳлҠ” 'л””м§Җн„ёмһҘмқҳмӮ¬', кі л №нҷ”к°Җ мӢ¬нҷ”лҗҳлҠ” 추세 мҶҚм—җм„ң лҸ…кұ°л…ёмқёл“Өмқҳ л§җлІ—мқҙ лҗҳм–ҙмЈјкі мқҙл“Өмқҳ мЈјкұ°мғқнҷңмқ„ лҸҢлҙҗмЈјлҠ” 'лҸ…кұ°л…ёмқё л§җлІ— лҸ„мҡ°лҜё', л№…лҚ°мқҙн„°лҘј к°Җкіөн•ҳлҠ” 'лҚ°мқҙн„° л§Ҳмқҙл„Ҳ' л“ұмқ„ л“Ө мҲҳ мһҲлӢӨ. мқҙ м§Ғм—…л“ӨмқҖ мҡ°лҰ¬ мӮ¬нҡҢмқҳ л©”к°ҖнҠёл Ңл“ңмҷҖ л§Ҙмқ„ к°ҷмқҙн•ҳлҠ” кІғмңјлЎң м Ғм Ҳн•ң м„ң비мҠӨк°Җ м ңкіөлҗҳл©ҙ мғҒлӢ№н•ң мҲҳмҡ”к°Җ нҳ•м„ұлҗ мҲҳ мһҲлӢӨ.
лҲ„кө°к°Җ мӢңмһҘмқ„ л§Ңл“Өм–ҙмЈјкі м•Ҳм •м Ғ мҲҳмҡ”к°Җ м°Ҫм¶ңлҗҳкё°лҘј кё°лӢӨлҰ¬кё°л§Ң н•ҙм„ м„ л°ңмһҗ(е…ҲзҷјиҖ…)мқҳ мқҙмқөмқ„ н–Ҙмң н•ҳкё° м–ҙл өлӢӨ. мӢңмһҘм—җм„ң кі к°қмқҳ мһ мһ¬мҲҳмҡ”лҘј м°ҫм•„ л§һм¶ӨмӢқ м„ң비мҠӨлҘј м ңкіөн•ҳлҠ” л°©мӢқмңјлЎң мқјмһҗлҰ¬лҘј м°Ҫм¶ңн•ҳлҠ” кІғмқҖ мһ¬м •м§Җмӣҗ л“ұ мқём„јнӢ°лёҢлҘј нҶөн•ҙ мқјмһҗлҰ¬лҘј л§Ңл“ңлҠ” кІғліҙлӢӨ л¶Җмһ‘мҡ©лҸ„ м Ғкі м§ҖмҶҚ к°ҖлҠҘм„ұлҸ„ нҒ¬лӢӨ. м •л¶Җм—җм„ңлҠ” мҷёкөӯмқҳ мӢ (ж–°)м§Ғм—…л“Өмқҙ мҡ°лҰ¬ л…ёлҸҷмӢңмһҘм—җ м•Ҳм°©н• мҲҳ мһҲлҸ„лЎқ кҙҖл Ё лІ•л №мқ„ м •л№„н•ҳкі м Ғн•©н•ң көҗмңЎнӣҲл ЁмқҙлӮҳ мһҗкІ©м ңлҸ„лҘј л§Ҳл Ён•ҳлҠ” л“ұ лӢӨм–‘н•ң м§Җмӣҗмқҙ н•„мҡ”н•ң л•ҢмқҙлӢ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