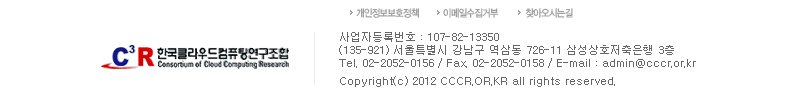이솝우화 중에는 개 흉내를 내다 낭패를 보는 당나귀 이야기가 있다.
당나귀는 주인이 어디를 가든 항상 함께 하고 묵묵히 옆을 지키는 동반자였다.
여행에 지친 몸을 쉬려고 숙소에 들른 주인은 친구 같은 당나귀를 추운 바깥에 둘 수 없어 안에서 쉬도록 했다.
주인이 식사를 시작하자 여관에 살던 개가 주인 옆에서 꼬리를 치고 손등을 핥는 등 재롱을 피웠다.
그러자 주인은 웃으며 개를 안더니 음식을 나눠주는 게 아닌가. 개가 부러웠던 당나귀는 자기도 재롱을 피우려고 주인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큰 덩치 때문에 그만 주인을 넘어뜨려 밟고 말았다.
당나귀는 결국 화가 난 주인에게 흠씬 두들겨 맞고 밖으로 쫓겨난다.
자신의 처지와 조건, 역할은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따라하다가 봉변을 당한 셈이다.
최근 의료분야에 빅데이터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빅데이터는 IDC, IBM 등 거의 대부분의 조사분석 업체들이 유망산업으로 꼽고 있는 분야다.
이 중에서도 의료분야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고 활용범위도 다양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전망이다.
맥킨지는 미국의 의료서비스 산업이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매년 3000억 달러에 달하는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역시 빅데이터의 중요성과 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정부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질병예방건강증진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1조3034억건의 데이터를 활용해 전국민의 10년간 자격과 보험료, 검진결과, 진료내역 등 총 747억건의 데이터가 내장된 국민건강정보DB를 구축했다.
또 국민건강주의 예보서비스를 구축, 전염병 등 급성질병에 대한 예보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빅데이터를 활용해 질병감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 아래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서비스가 정부나 공공기관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추진해야 할 빅데이터 사업인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 사업의 아이디어는 구글의 2008년 독감 예측 서비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이용자의 검색 데이터를 활용해 전세계 독감 유행 수준을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시도를 해 큰 효과를 거뒀고 빅데이터 활용의 대표적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대도시에 밀집돼 있고 IT인프라가 갖춰져 질병발생 정보의 수집과 집계가 신속하게 이뤄지는 환경에서 과연 이 서비스가 어떤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고 다양한 의료정보기관이 연결돼 디지털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같은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신약 개발과 만성질환자 및 개인건강 관리 등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등이 역할을 분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의료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데이터의 신뢰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의미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익명성에 기반한 데이터 관리 기술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
관련 기관과 기업 역시 개별 영역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빅데이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더 이상 개를 흉내 내는 당나귀 방식으로는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겨룰 수 없기 때문이다.